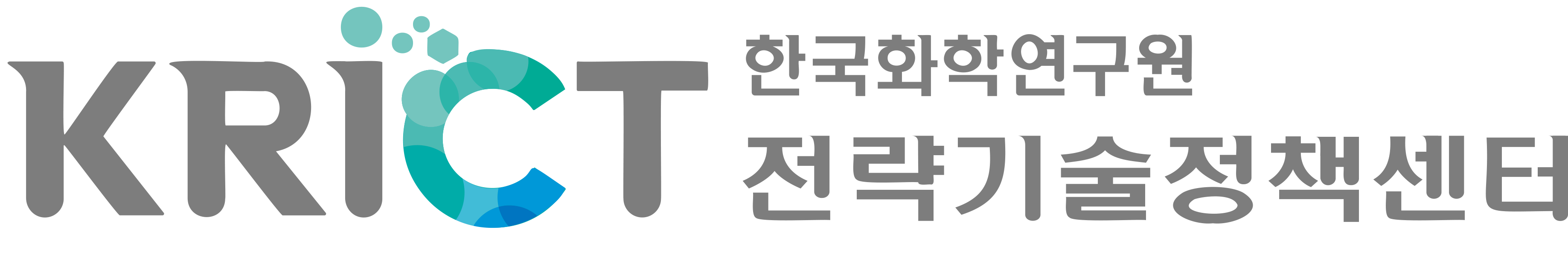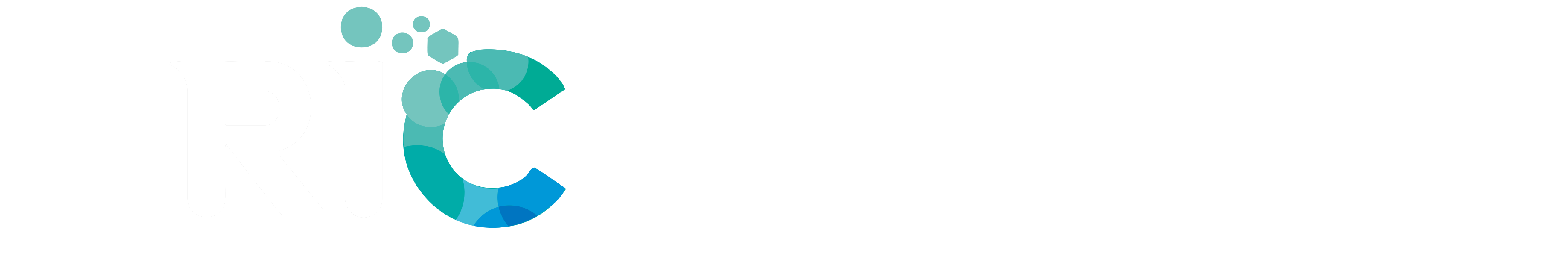[요약]
- 전기차 개발 등 친환경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 필요
- 연구진은 준고체 전해질(QSSE) 중 LiNO3를 대체할 새로운 질산염 기반 첨가제(TEGDN)를 개발하여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크게 기여
-
독일 Bayreuth 대학 Francesco Ciucci 교수는 중국 연구진과 협력하여 준고체 전해질(QSSE)에 사용되는 질산리튬(LiNO3)과 1,3-디옥소란(DOL)의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리튬배터리 개발에 크게 기여
- 최근 차세대 이차전지 중 짧은 충전 시간, 높은 에너지 밀도 및 높은 안전성을 가진 전고체 리튬배터리가 주목
-
- (필요성)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
- 배터리의 용량 증량을 위해 단순히 기존 배터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배터리 가격 상승과 공간 효율성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부적합
- 따라서 기존 배터리에 비해 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가 필요
- (필요성)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인 배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
-
- (특징)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해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또한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기반의 기존 배터리와 달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을 줄이고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물질을 채워 에너지 밀도가 높음
- (특징)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해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
- 전고체 배터리에 쓰이는 전해질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어 특징이 다양
-
- (분류) 전해질(electolyte)은 전고체 전해질과 준고체 전해질로 분류되며, 전고체 전해질은 무기질 고체 전해질(ISE), 고체 고분자 전해질(SPE), 복합 고분자 전해질(CPE) 등으로 더 세분화
- ISE는 높은 이온 전도성, 계수, 전송수가 있지만 깨지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전극에 대한 호환성과 안정성이 저하
- SPE는 용해 주조(solution casting)를 통해 제조하기가 쉬워 대규모 제조 공정에 적합하고 높은 탄성과 가소성을 가지나 이온 전도도가 ISE보다 낮고, 속도가 낮아 고속 충전에 제한적
- (분류) 전해질(electolyte)은 전고체 전해질과 준고체 전해질로 분류되며, 전고체 전해질은 무기질 고체 전해질(ISE), 고체 고분자 전해질(SPE), 복합 고분자 전해질(CPE) 등으로 더 세분화
-
- (특징) 준고체 전해질(QSSE)은 액체 전해질과 고체 매트릭스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해질로, 액체 전해질은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고체 전해질은 안정성을 향상
- 젤(gel) 폴리머 전해질(GPE), 이오노겔(ionogel) 전해질, 젤 전해질 등 여러 범주로 세분화
- (특징) 준고체 전해질(QSSE)은 액체 전해질과 고체 매트릭스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해질로, 액체 전해질은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고체 전해질은 안정성을 향상
- 준고체 전해질의 현장 중합은 안전한 고성능 전고체 리튬-금속 배터리 개발을 위한 방식 중의 하나
-
- (특징) poly-DOL 기반 전해질은 넓은 전기화학적 창(EW)과 리튬 금속과의 강력한 호환성으로 인해 특히 매력적인 소재로 꼽히고 있으며, 배터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튬 금속 양극 표면에 효과적인 Li3N와 풍부한 고체 전해질 계면을 생성하는 LiNO3를 주로 사용
- 그러나 LiNO3은 poly-DOL의 고리열림(개환) 중합을 방해하여 두 화합물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특징) poly-DOL 기반 전해질은 넓은 전기화학적 창(EW)과 리튬 금속과의 강력한 호환성으로 인해 특히 매력적인 소재로 꼽히고 있으며, 배터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튬 금속 양극 표면에 효과적인 Li3N와 풍부한 고체 전해질 계면을 생성하는 LiNO3를 주로 사용
- 연구진은 LiNO3를 대체할 새로운 질산염 기반 첨가제인 트리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TEGDN)를 개발
-
- (특성) LiNO3와 마찬가지로 TEGDN은 리튬 표면에 밀도가 높고 질소가 풍부한 고체 전해질 간기를 형성하여 기생 반응으로부터 리튬을 보호
- LiNO3와 달리 TEGDN은 poly-DOL의 중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실온에서 2.87mScm-1의 이온 전도도와 4.28V의 산화 안정성 전위를 제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전해질을 제조
- (특성) LiNO3와 마찬가지로 TEGDN은 리튬 표면에 밀도가 높고 질소가 풍부한 고체 전해질 간기를 형성하여 기생 반응으로부터 리튬을 보호
-
- (입증)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배터리 셀 제작 및 실험
- 41C에서 2,000회 이상 안정적으로 재충전되는 Li|LiFePO 코인형 셀 제작에 성공
- 이에 초기 비에너지가 304W·h·kg-1이고, 50사이클 후 용량 유지율이 79.9%인 1.7A·h 파우치형 Li-S 전지 제작
- (입증)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배터리 셀 제작 및 실험
[시사점]
-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액체전지에 사용되던 제조 방식을 유지하며, 안전성과 내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도 용이한 리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가능할 전망
- 준고체 전해질을 위한 효과적인 첨가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분자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연구 결과가 poly-DOL 기반 준고체 전해질 배터리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내에서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2027~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
[출처]
-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란 무엇일까?, 2020.9.23.
- TechXplore, Neste to enable PET bottles produced with bio-based materials with Suntory, ENEOS and Mitsubishi Corporation, 2023.8.24.
- Wikipedia. Solid-state electrolyte, 2023.8.
- 오피니언뉴스, 전고체 배터리’ 테마 어디까지…LG엔솔 등 배터리 3사에도 눈길, 2023.6.14.
-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리튬이온전지 핵심소재 기술 및 시장동향, 2020.